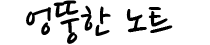철학통론
2011. 03. 02.
~ (w01 ~ )
~ (w01 ~ )
김성수 교수님
제 1 강의 : 인식론(지식론)
인식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였던 진리대응론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이다. 진리대응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주어진 명제a proposition1가 기술하는 바와 세계가 일치하면 사실이다true. 둘째,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false.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명제를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지라도, 명제를 처음에 제시할 때에는 아마도 사실이든 아니든 정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즉 어떠한 명제이던 사실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대응론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앎의 가능성know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둘째는 명제의 참과 거짓의 여부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지believe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셋째, 명제는 항상 참 아니면 거짓 중에서 하나를 가진다는 점이다.
2011. 03. 07.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리대응론을 전제로 삼고 인식론, 지식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인식론, 다른 말로 하면 지식론이라 불리는 이론철학이 무엇을 논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에서는 지식의 본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지식이 정말로 가능한 지에 대해 고찰을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이전에 나는 먼저 지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려고 한다. 아래는 3개의 지식에 대한 명제를 구분해 본 것이다.
가) 나는 영수를 안다. - knowledge by acquaintance
나)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 know how
다) 나는 오늘이 수요일이란 것을 안다. - propositional knowledge, knowing that
이 중에서 철학자들이 주로 질문을 던지는 대부분의 명제는 (다) 유형, 즉 명제적 지식이다. 그 이유는 명제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이유는 명제적 지식이 know how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서 물었듯이 지식이란 무엇일까? 나)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 know how
다) 나는 오늘이 수요일이란 것을 안다. - propositional knowledge, knowing that
앞서 말했듯이 인식론이란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론철학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되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제 지식에 대한 명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proposition : S는 p를 안다. if and only if (필요충분조건)
분석 - 1)
아마도 지식이란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분석해보는 것 보다는,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흔히 우리들은 어떠어떠한 것에 안다고 하면, 그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지식이 된다고 말 할 수 있을까?분석 - 1)
ㄱ) S는 p를 안다. if and only if
ㄴ) S는 p를 믿는다.
분석 - 2)
ㄱ) S는 p를 안다. if and only if
ㄴ) S는 p를 믿는다.
ㄷ) p는 참이다.
ㄴ) S는 p를 믿는다.
ㄷ) p는 참이다.
분석 - 3)
ㄱ) S는 p를 안다. if and only if
ㄴ) S는 p를 믿는다.
ㄷ) p는 참이다.
ㄹ) +a
ㄴ) S는 p를 믿는다.
ㄷ) p는 참이다.
ㄹ) +a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명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례를 하나 떠올릴 수 있다면 명제에 대한 그 분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처음에 나온 'S는 p를 안다'는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어떠한 정보원으로 p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저 장난스러운 이야기나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취급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 지식이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believe을 일단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어떠어떠한 사실이 적어도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올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것 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지식이란 우리가 일단 믿어야함을 물론 이거니와 그 지식이 참지식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지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지식이란 먼저 우리가 믿어야하며, 그리고 지식이 될 어떠어떠한 사실이 참인 사실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지식에 대한 머리 아픈 고민이 해결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 하다. 이 명제의 경우에도 반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반례는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듯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믿게 된 어떠어떠한 사실, 즉 명제가 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들은 우리가 알게 된 어떠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대로 일단 지식의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어떠한 사실은 참인 믿음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떠어떠한 사실이 지식이라고는 수긍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참인 믿음인 어떠어떠한 사실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것은 아마 정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아지면 확실성이라든지 등등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참인 믿음인 어떠어떠한 사실이 지식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철학자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데카르트Descartes의 이론 : 지식과 확실성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시기는 고대, 고전 시대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고민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2라는 말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이다.
데카르트의 저 말이 굉장히 유명하다보니 데카르트를 그저 그런 철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데카르트가 철학에 대해서 깊게 고심하고 글을 쓴 것은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제는 삶이 여유로워진" 후기의 데카르트 때부터이다. 데카르트가 철학 외의 분야에서의 업적은 먼저 수학에서는 분석 기하학과 지수 체계,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틀을 다졌으며,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인 운동량 보존법칙과 함께 데카르트의 법칙, Vortex 이론에 대해서 썼으며, 심리학에서는 시각과 뇌, 감정에 대해서 다루었다. 즉, 전형적인 르네상스맨이었다.
그는 바빴던 젊은 시절에 지식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그의 말대로 조금 여유로워진 말년에 지식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계기는 그가 쓴 『성찰』의 첫 머리에서 말하고 있다.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즉,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아무튼 데카르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회의를 품은 결과, 나름대로의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성찰』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자면, 지식, 즉 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여야 하며, 그 참된 믿음은 확실성을 가져야
온전히 지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르네 데카르트 저 : 이현복 역, 『성찰』, 문예출판사, p.34
데카르트는 이러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제 1 성찰과 제 2 성찰에서 밝히고 있다. 제 1 성찰에서는 이 글을 지식에 대해 논의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절차와 전능한 악마의 가설을 나타내고 있다. 데카르트의 목적은 앞서 인용한대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즉 다른 지식의 토대가 되는 확실한 지식,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내는 데에 있었다. 이는 데카르트의 가정으로 토대론foundationalism3을 말한다.
데카르트는 이 확실한 토대가 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회의와 의심의 방법method of doubt4이다. 그가 먼저 이 방법에 대해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거짓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해보았으며, 그 다음에는 과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 틀렸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가능하였다.
데카르트는 지식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생각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밟았다. 그것은 믿음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눈 것인데, 하나는 경험적 믿음a posteriori beliefs5이며 나머지 하나는 선험적 믿음a priori beliefs6이다. 데카르트는 먼저 경험적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가졌었던 경험적 근거에 있다. 즉, 경험이 항상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가 이에 대해 스스로 반론해 보기를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믿음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타이핑을 하고 있는 두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의심이나 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a sensibus 혹은 감각을 통해서per sensus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감각이 비록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종종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각으로부터 알게된 것 가운데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두 손이 그리고 이 몸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나 감각이 비록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종종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각으로부터 알게된 것 가운데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두 손이 그리고 이 몸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 위의 글, p.35
2011. 03. 09.
하지만 데카르트가 거기서 생각을 끝을 낸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이 반론에 대해 재차적으로 반론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꿈 논증dream argument이다. 꿈 논증은 영화 매트릭스Matrix와 비슷하다. 데카르트가 꿈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바로 꿈에서의 경험과 현세에서의 경험이 과연 다른가였다. 장자의 유명한 장자지몽처럼, 데카르트도 자신 또한 생생하였던 꿈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그가 내놓은 결론은 경험에 근거한 모든 믿음들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험에 근거한 모든 믿음들은 확고한 토대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어 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줄 어떤 징표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케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빠져 들게 된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지식의 확고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아닌, 선험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였다. 선험적 지식이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이성을 통한 추론으로 인식이 가능한 지식을 말하는데, 데카르트는 이러한 선험적 지식이 우리가 경험을 하기위한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그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 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들의 예로는 연장extension, 모양shape, 양quantity, 크기size 등이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의 이해가 선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위의 글, p.36
이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꿈 논증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믿을 수 없지만, 다만 수학적 믿음 만큼은 믿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형태나 양, 크기, 수 등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것들을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는 다른 생각을 한 번 해본다.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중에 분명한 진실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7.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에 대해서 더 생각해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전능한 악마evil demon8이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전능한 신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전능한 악마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가정하기를 이 전능한 악마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하였다.
전능한 악마가 데카르트에게 하는 일은 모든 힘을 써서 데카르트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는 것이다. 즉, 여기에 노트북이 없지만, 마치 내가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손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만들수도 있다. 산이 없지만 산이 있고, 사실 1+1=4 이지만 1+1=2 이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다. 데카르트가 이러한 전능한 악마를 생각해본 결과, 만약 정말로 전능한 악마가 가능하다면 수학적 믿음, 지식 또한 거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떠한 감각도 갖고 있지 않으며, 물체, 형태, 연장, 운동 및 장소도 환영chimerae 이외에 다름아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뿐이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게 되자, 데카르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내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 2 성찰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 위의 글, p.43
데카르트가 인식론, 지식론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지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확실한 토대를 데카르트는 자신이 쓴 제 2 성찰에서 증명한다. 제 2 성찰은 서론과 Cogito, ergo sum 그리고 Ambulo ergo sum 순이다.
데카르트는 먼저 서론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생각하는 것. 데카르트가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길,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즉, 믿는다던가, 의심한다던가, 판단한다던가, 느낀다던가 등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데카르트는 생각cogitatio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p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p에 대하여 전능한 악마가, 정말로 p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p가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내린 결론은 '가능하다'였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들자, 데카르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테지만, 이내 확실한 믿음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것에 대한 추리과정은 이러하다. 데카르트는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이런 경우에 과연 전능한 악마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전능한 악마가 나로 하여금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게 만드는 것 자체로 이미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다다르자, 데카르트는 전능한 악마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rgo sum. 즉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지식의 확실한 토대가 되는 믿음이었다.
"감각한다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물론 신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또 꿈 속에서 많은 것을 감각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감각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발견한다. 사유cogitatio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이 나와 분리divelli될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Ego cogito, ergo sum. 이것이 데카르트의 확실한 토대가 되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당대의 몇몇 신학자,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하고는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걷는다, 나는 존재한다9"이다. Ambulo ergo sum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생각한다는 것만을 명제로 내놓았는가?"이다.
- 위의 글, p.46
2011. 03. 14.
각주
- 1) 명제a proposition : "눈은 하얗다." / "Snow is a white" - 두 문장은 모양이나 소리 등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서로 같다. 이처럼 명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의미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제는 위의 두 문장과 같이 각기 다른 문장이 하나의 명제로서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의 문장이 여러 명제로 해석될 수 있다. ex) "나는 핸드폰을 사용한다." [본문으로]
- 2) Ego cogito, ergo sum [본문으로]
- 3) 토대론foundationalism : 데카르트가 가정했던 이론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식에는 그 지식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 있으며, 토대가 되는 지식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지식super-structural beliefs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이론을 통해서 완전히 정당화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으로]
- 4) 회의와 의심의 방법method of doubt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그 믿음이 거짓이 가능한 지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본문으로]
- 5) 경험적 믿음a posteriori beliefs :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 [본문으로]
- 6) 선험적 믿음a priori beliefs : 감각경험과 독립적인 근거를 갖는 믿음. 즉, 이성에만 근거를 둔 믿음. [본문으로]
- 7) 이것은 데카르트에게 있어 진실이다. 『성찰』의 서문과 같은 파트에서 데카르트가 밝힌 글을 쓰는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는 철저한 유신론자다. 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으로]
- 8) 『성찰』에서는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genium aliquem malignum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본문으로]
- 9) Ambulo ergo sum [본문으로]